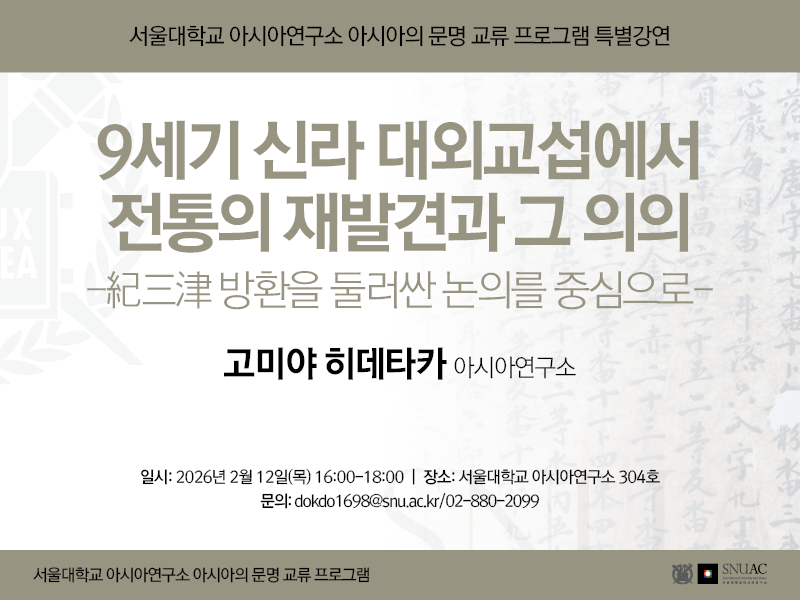![[내일신문] 임현진 칼럼 – 국가주의의 그늘, 감시와 통제 [내일신문] 임현진 칼럼 – 국가주의의 그늘, 감시와 통제](https://snuac.snu.ac.kr/2015_snuac/wp-content/uploads/2020/07/4912-20070623_1_0.jpg)
[내일신문] 임현진 칼럼 – 국가주의의 그늘, 감시와 통제
[창립소장 임현진 교수(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꼰대 No.” 펭수가 ‘개저씨’ 보고 하는 말이다. 미국의 젊은세대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우리보다 더 끔찍한 표현을 쓴다. 코로나19가 베이비부머, 즉 꼰대를 제거하는 전염병이라는 의미로 쓰는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가 그것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나이 어린 건강한 숙주를 통해 존속력을 오래 유지하는 특성을 지닌다. 20대 전후 활발한 젊은이들은 감염이 되더라도 증세를 보이지 않지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걸리면 치명적이다.
개성을 존중하는 자유분방한 젊은세대는 집합지향적이고 규율강제적인 노년세대와 부딪친다. 노년세대의 생각이나 행태를 구식을 넘어 구제불능으로 본다. 특히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를 맞이해 젊은세대는 앞으로 유년층과 노년층을 먹여살려야 한다. 일하고 즐겨야 하는데 부담이 너무 큰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19 이후 바뀌는 세상의 단면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죽고 사는 문제가 중첩된다. 어쩔 수 없이 각자도생의 개인주의와 자국 중심의 국가주의가 맞물린다. 시민사회를 넘어 세계체제 수준에서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지만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족 인종 계급 종교 집단 세대 성별 간의 혐오와 차별이 늘어나고 갈등과 대립은 깊어지고 있다. 국가의 귀환, 사회의 위축, 새로운 세계의 등장이다.
20세기 초반 스페인독감 이후 최대의 팬데믹이라 할 코로나19가 세상을 혼돈으로 이끌고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의 욕망을 위한 발전패러다임을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생태친화적인 것으로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 세계적 유행 6개월 만에 확진자가 1000만명, 사망자가 50만명을 넘었다. 비록 치사율은 떨어지지만 전파력이 워낙 강하다. 일반 독감처럼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변이를 거듭해 치료제가 나온들 효과가 반감되고 백신도 계속 개선해야 항체가 만들어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국가의 귀환, 사회의 위축
코로나19의 방역에서 최대의 효과를 지니는 국경봉쇄 지역차단 이동제한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개인의 이동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 소지가 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비대면과 비접촉의 일상에서 실제와 가상이 합쳐진 현실에서 살아가야 한다.
수시로 만나지만 쉽게 헤어지는 디지털 공간에서 끈끈한 정의(情誼)적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다. 시민은 고독·소외와 홀로 싸워야 한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의 고통이 심하고 사회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인간은 신체적으로 만나고 정서적으로 통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물리적으로 간격을 유지하다보니 이해와 교감의 기회가 줄어든다. 디지털 공간에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을 배가해 공통의 규범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자본의 토대가 약화되어 제아무리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고 복지를 제공한들 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는 공황과 전쟁을 합친 수준의 세기적 재난이다. 인류의 현명한 대처가 따르지 않으면 문명적 위기로 전화될 수 있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하면 국가주의라는 중앙집중의 전제적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직이 늘어나고 개입이 강화되는 큰 국가의 도래가 예상된다. 이러한 국가의 귀환이 좋은 쪽보다 나쁜 방향으로 간다면 사회의 위축과 더불어 시민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해 시민사회로부터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른바 K-방역의 효과적인 구현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협치를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 정부의 선도적 리더십이 초기에 중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시민의 능동적 팔로우십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성공적 경우가 독일이라면 그 반대의 경우가 미국이다.
디지털 빅브라더의 등장
아래부터의 자발적 동참 없는 위로부터의 강제적 동원은 디지털 ICT로 무장한 국가라는 빅브라더에 의한 통제와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시민의 사생활을 일일이 간섭하는 무시무시한 현대판 ‘판옵티콘’(Panopticon)에 다름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포용해야 할 구성원이다. ‘OO번 확진자’ 혹은 ‘수퍼 전파자’라는 단어에는 이미 혐오 차별 낙인이 배태되어 있다. 시민 개개인의 자유권 존엄성 자존감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방역만 지향할 때 포스트 코로나의 디지털 공간은 교감이 아닌 적대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나만 깨끗하고 전염병이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자라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결코 감염병이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시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협동하고 연대해야 할 대상이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리고 주변부에 위치한 취약계층을 품음으로써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