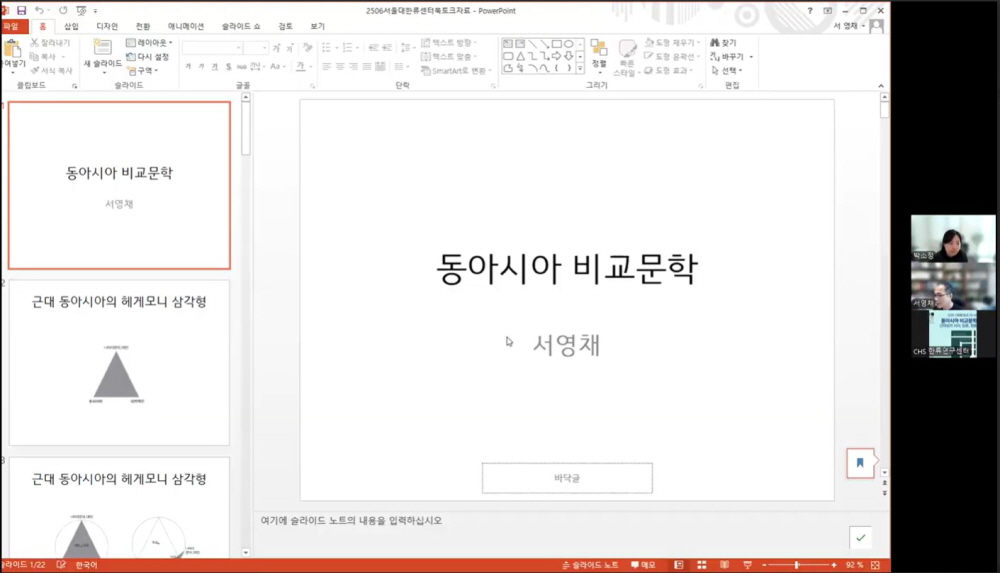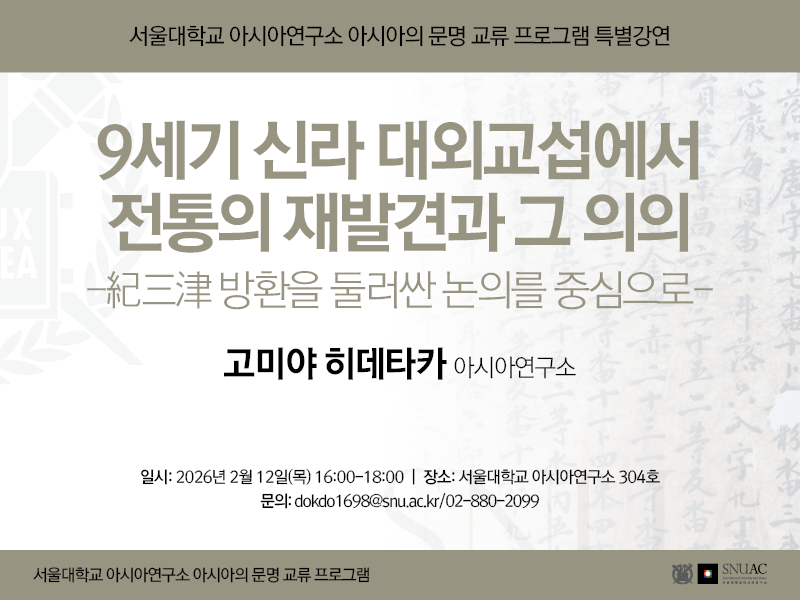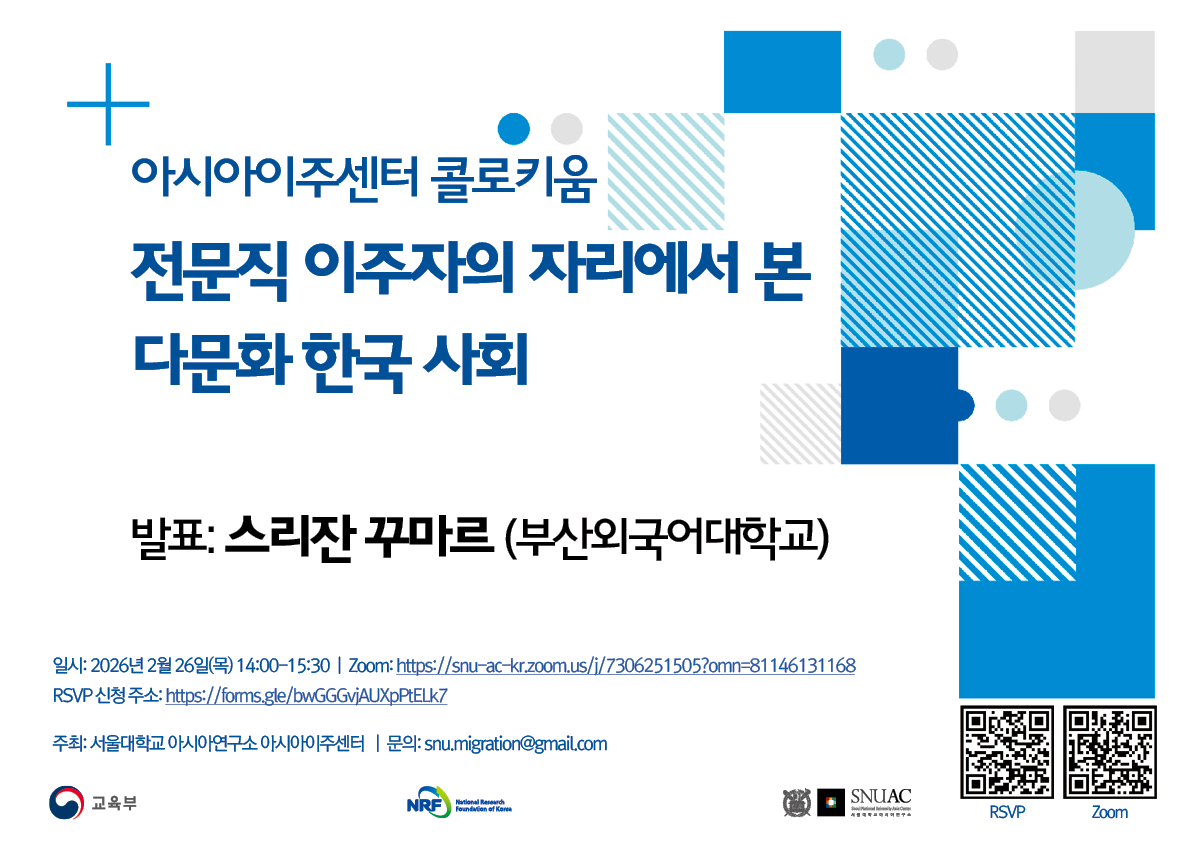Speakers
서지영 박사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한류연구센터『동아시아 비교문학』은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근대적 주체 형성의 드라마를 문학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중일 세 개 언어권의 근대문학 작품을 함께 다루는 이 책은 동아시아의 문학 속에서 표현된 근대적 주체 형성의 드라마를 포착해낸다. 난폭한 외부자로서의 근대성과 맞닥뜨렸을 때, 동아시아 사람들을 스쳐간 마음의 표정을 문학의 시선으로 보고자 한다. 주로 역사 존재론적 맥락의 비교를 통해 한 집단이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과 한 개인에게서 드러난 존재론적 간극이 합해진 결과를 목격하게 된다. 이 둘이 겹쳐지면서 만들어내는 드라마를 포착해내는 일이란, 근대 동아시아가 지닌 고유의 장소성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한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역사적 풍토 세 겹이 겹치고 꼬임으로써 생겨나는 인문적 맥락은, 그 자체가 동아시아적 드라마의 모태이자 장소성으로서, 근대적 주체 형성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서영채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 부임하였다. 문학의 존재론적 지위를 생각하기 위한 인문학 이론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엮어지는 동아시아 근대성의 맥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발표: 서영채 (서울대학교)
토론: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최현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 서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
Photos
Review
2025년 6월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서영채 교수는 한류연구센터 주최 CHS 100분 토크에서 『동아시아 비교문학: 근대성의 서사, 담론, 정동』을 주제로 북토크를 진행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국내외 연구자 및 학생들 총 42명의 연구자와 청중이 참석하였으며, 서영채 교수는 동아시아 근대성을 서사–담론–정동이라는 삼중 구조로 분석해, 근대 이후 동아시아 사유의 윤리적 가능성을 성찰하고자 했다.
서영채 교수는 동아시아의 근대성을 “외심으로서의 근대성”이라 명명하며, 근대가 동아시아 내부가 아닌 외부(특히 일본의 해안선 개방)를 통해 도입된 충격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를 시각화한 ‘근대 동아시아의 헤게모니 삼각형’ 도식을 통해 일본(해양), 중국(저항의 힘), 조선(식민지)의 위치를 설명하며, 동아시아는 ‘내심’이 아닌 ‘외심’으로서 근대성에 반응해왔고, 이 외심과의 거리에서 정서적 긴장과 주체 형성이 촉발되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영채 교수는 “세 개의 동아시아”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허한 객관으로서의 ‘무의미한 동아시아’, 둘째, 제국주의적 자기기만이 반영된 ‘미친 동아시아’, 셋째, 사유의 장으로서의 ‘유령 동아시아’이다. 그는 마지막 유형의 동아시아를 통해, 문학적 상상력과 윤리적 사유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영채 교수는 이어 동아시아의 근대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공리주의와 생존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근대성, 진정성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 윤리적 근대성, 예술적 모더니즘을 통한 심미적 근대성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이 세 가지가 각각 ‘장남(계몽)–둘째 아들(진정성)–막내 혹은 탕아(예술)’라는 가족 서사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하며, 문학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불안, 윤리, 창조성의 사유를 가능케 하는 장이라고 보았다.
‘불안’은 동아시아 근대 문학에서 핵심 정동으로 작동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나쓰메 소세키는 ‘고등 유민의 불안’(자살), 루쉰은 ‘좌불안석의 불안’(처형), 이광수는 오히려 불안을 결여한 결핵형 주체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감정의 지형 위에서 둘째 아들의 서사는 진정성을 추구하며, 다자이 오사무와 이상의 문학은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막내 서사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담론 분석에서는 라캉의 이론을 바탕으로 일본 문학과 정치의 전개를 ‘주인 담론–히스테리 담론–대학 담론’으로 구분했다. 그는 메이지 유신기의 명령적 구조, 파시즘기의 광증, 패전 이후의 학문화된 자기 성찰이 각기 다른 담론 구조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정동의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문학이 감각해온 ‘죄의식’과 ‘부끄러움’의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광수(죄 없는 죄의식), 최인훈(정언명법으로서의 죄의식), 이청준(빈곤이 초래한 수치심), 임철우(정치적 폭력에 대한 부끄러움), 신경숙(존재 조건에 깃든 부끄러움), 한강(고통의 미메시스) 등은 동아시아의 윤리 정동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로 제시되었다. 발표 이후 토론에는 백원담 교수(성공회대)와 최현희 교수(한국외대)가 참여해, 발표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