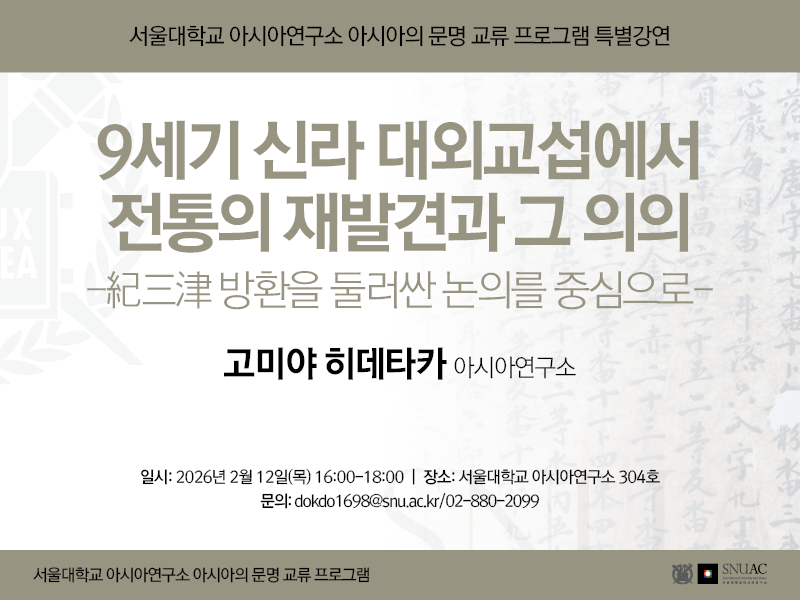![[내일신문] 임현진칼럼 – 멀리 보고 같이 가자 [내일신문] 임현진칼럼 – 멀리 보고 같이 가자](https://snuac.snu.ac.kr/2015_snuac/wp-content/uploads/2020/01/4794-20011423_1_0.jpg)
[내일신문] 임현진칼럼 – 멀리 보고 같이 가자
[창립소장 임현진 교수(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우리 사회 원로들을 뵈면 한결같이 나라 걱정이 많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고민한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퍼주기 복지, 가계부채 증가, 국가재정 악화, 한미동맹의 간격, 남북관계 긴장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가라는 것은 그리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라면서 현정부의 잘잘못을 가려 격려와 비판을 동시에 부탁드리지만, 그분들은 내 얘기가 미덥지 않은지 망국의 역사적 사례를 들곤 한다.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워야
가장 걱정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분열과 대립이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초동과 시청 앞에서 서로 다른 시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서로 적대적이고 소모적이 되는 것 같다. 오죽하면 ‘교수신문’이 공명지조(共命之鳥)를 2019년의 사자성어로 뽑았을까. 불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새이지만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라 서로 으르렁대며 혼자만 살려다가 결국 죽고만다. 갈라지고 찢겨진 한국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준다.
나는 한국사회의 분열을 단지 좌우이념의 대립으로 보지 않는다. 오랜 기간 쌓인 계층 세대 지역의 갈등 위에 미래지배를 위한 세력화의 성격을 지닌다. 보수가 보는 ‘종북좌향좌’도 아니고 진보가 보는 ‘수구우향우’도 아니다. 이른바 ‘좌빨’이고 ‘꼴통’을 가리지 않고 이념은 깃발만 보일뿐 가치보다 이해를 추구한다. 기득권을 깨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가지려고 할 뿐이다.
왜 보수는 “보나마나 수구”, 그리고 진보는 “진짜 보수”라 할까. 자유의 오래된 가치인 계몽의 정신을 잃은 보수, 해방의 가치를 버리고 진부한 평등의 논리에 빠져있는 진보가 그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1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원시적(遠視的) 비전과 총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진보와 보수 모두 격변의 미래를 독점하려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같이 전망하고, 혁파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왜 386이 50대가 되면서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이 되었을까. 반독재를 위한 투쟁이 인권과 계몽으로 이어졌지만 민주주의를 얻는 데 희생한 만큼 힘 있게 만들고 가꾸는 데 무지했다. 오늘의 한국에서 개혁은 세력화를 위해 편용되고 있다. 내각제와 친화력을 지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없이 그것도 지역구는 그대로 나둔 채 30석 비례에 한도를 정해둔 선거제를 진정 개혁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소수의 사회경제적 특혜를 바꾸겠다는 개혁이란 이름 아래 정사(正邪)에 대한 판단없이 이뤄지는 불의 탈법 비리도 없지 않다. 이를 덮으려고 하는 거짓말이 더 문제다.
이 와중에서 기회의 평등을 갈구하는 젊은 세대는 특권과 반칙에 분노하고 있다. 청년의 좌절이 ‘N포’로 이어지면서 미래의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흰쥐의 경자년(庚子年)을 맞이해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반환점을 돌면서 밝힌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환영한다. 이제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하중으로 미래의 창출이 발목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제를 부수는 것은 쉽지만 신체제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경실련’에 의하면 현정부의 공약의 완전이행도가 18.3%에 불과하고, 후퇴이행이 21.3%에 달한다. 여야협치가 실종되면서 개혁입법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려 행정부 사법부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민생현안의 정책을 보면 이상은 높은데 현장에 대한 숙고가 부족하다. 정책을 이념으로 호도하면 현실적합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되었다. 성장절벽, 재정절벽, 국가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혼자 가면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지만 같이 가면 어려움을 나누면서 멀리 갈 수 있다. 혼자 살려는 고집을 버리고 다 같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합쳐야 한다.
정책은 실사구시다
올해 총선 이후 여야는 유아독존적 사고를 버리고 미래창발적으로 한국의 생존을 성찰하고 공영을 기획하는 열정과 지혜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한 나라의 영도자는 직언을 주저하지 않는 참모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 사회평론가가 대통령의 주변에 간신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합의로 갈등을 해결하는 최적의 제도다. 대의민주주의가 한계가 있지만 직접민주주의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의회정치가 죽었다고 국회를 우회하여 시민정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면 혼란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 ‘공론화 심화를 위한 숙의’(diliberation)나 ‘대표성 제고를 위한 협의’(consociation)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장의 촛불은 막힌 정치를 풀어주지만 일상화되면 오히려 균열과 대결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튼실한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치의 정치가 중앙과 지방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